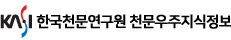모달창 닫기
- 홈으로 이동
천체물리/우주론
Q.분광형에 따른 별의 밝기 분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0-02-23
A.별을 분류할 때, 겉보기 밝기 별로 별의 분광형 (spectral type)을 통계낸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통계가 천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별의 분광형은 별 대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겉보기 등급만으로는 별의 특성을 알 수 없으니까요.
별의 절대광도에 따른 별의 개수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광도함수 (luminosity function)"라 하는데 이 광도함수에 나타난 별의 밝기 분포는 밝을 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어두운 별일 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분포를 보입니다. 따라서 별의 개수 분포는 어두운 별, 즉, G, K, M형 왜성이 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역서에 수록된 겉보기 등급이 3등급 보다 밝은 별 96개의 분광형 분포는,
O -> 4, B -> 22, A -> 28, F -> 7, G -> 7, K -> 21, M -> 7 : 계 96개
로 나타납니다. O나 B형이 "광도함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은하 원반에 젊은 별들이 많은 데다가, 이 별들이 숫자가 적더라도 밝기 때문이고, K, M형의 경우에는 거성과 초거성이 많고,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A 형이 많은 이유는 젊은 은하 원반에 속한 별들 중에 OB형 보다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FGKM형별보다 개수는 적지만 밝은 별이 상대적으로 많아 태양 주위에 가장 많은 수의 A형별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것은 겉으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항성의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별의 분광형을 구하였죠 ? 실제로 A형은 수소의 흡수 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가 다른 별보다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류를 통계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분류에 속한 것을 주로 선택하는데 따른 선택효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샘플"을 정하는 것과 자료를 분석할 때 어떤 선입관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향 (bias) -위의 경우에는 흡수선의 세기-이 나타나는지를 잘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별의 절대광도에 따른 별의 개수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광도함수 (luminosity function)"라 하는데 이 광도함수에 나타난 별의 밝기 분포는 밝을 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어두운 별일 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분포를 보입니다. 따라서 별의 개수 분포는 어두운 별, 즉, G, K, M형 왜성이 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역서에 수록된 겉보기 등급이 3등급 보다 밝은 별 96개의 분광형 분포는,
O -> 4, B -> 22, A -> 28, F -> 7, G -> 7, K -> 21, M -> 7 : 계 96개
로 나타납니다. O나 B형이 "광도함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은하 원반에 젊은 별들이 많은 데다가, 이 별들이 숫자가 적더라도 밝기 때문이고, K, M형의 경우에는 거성과 초거성이 많고,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A 형이 많은 이유는 젊은 은하 원반에 속한 별들 중에 OB형 보다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FGKM형별보다 개수는 적지만 밝은 별이 상대적으로 많아 태양 주위에 가장 많은 수의 A형별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것은 겉으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항성의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별의 분광형을 구하였죠 ? 실제로 A형은 수소의 흡수 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가 다른 별보다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류를 통계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분류에 속한 것을 주로 선택하는데 따른 선택효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샘플"을 정하는 것과 자료를 분석할 때 어떤 선입관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향 (bias) -위의 경우에는 흡수선의 세기-이 나타나는지를 잘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