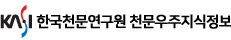모달창 닫기
- 홈으로 이동
천체물리/우주론
Q.백색왜성이란 무엇인가요?
2010-02-23
A.백색왜성은 수명을 다한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을 가진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성이론에서 별 중심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과 맞서는 것이 팽창하려고 하는 가스의 압력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발생하여 이 압력이 생겨나며, 이것이 별이 붕괴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의 중심부에 있는 핵연료를 소모하여, 중심에서 밖으로 핵융합 지역이 옮겨감으로써 별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가 거성 단계입니다.
만약 사용 가능한 핵연료를 모두 소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를 모두 소모하게 되면 별이 수축하겠지요. 더 이상 압력이 중력을 지탱할 수 없게되니까 말이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심부는 급격하게 수축하는데 반하여 별의 외각은 아직도 산발적으로 핵반응이 일어나거나 팽창하고 있어 중심부와 외각부분이 분리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별의 겉 거죽이 밖으로 팽창하는 단계를 행성상 성운이라 부릅니다.
두 별이 쌍으로 있는 쌍성의 경우에는 더 재미있는 상태가 됩니다. 둘 중 질량이 큰 놈 (주성)이 먼저 진화하여 거성-초거성 단계로 진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성이 팽창하여 마침내 주성의 외각부분에 있는 가스가 질량이 작은 반성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최후에는 주성의 질량이 반성 쪽으로 이동하여 반성의 질량이 주성보다 커지고, 핵연료를 모두 소모한 주성은 수축하게 됩니다.
핵연료를 모두 소모한 별은 수축하여 무한히 작아질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질량이 태양의 1.44배 이하인 별의 경우 핵연료를 모두 소모한 별의 내부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밀도는 아주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자역학적으로 전자는 축퇴되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자 하나가 차지해야 하는 공간은 양자역학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보다도 작은 공간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들 사이에 배타적인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축퇴압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축퇴압력이 중력에 맞서게 됩니다. 이것이 백색왜성인데 빛은 중력에너지, 즉 위치에너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태양질량의 1.44배보다 크고 태양의 수 (3- 8배)보다 작은 별의 경우에는 중력이 축퇴압력을 넘어 전자축퇴는 붕괴되어 수축하여 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별의 온도가 높고 압력도 높은 상태에서는 양성자 + 전자 --> 중성자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거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천체가 되는데, 이때 전자와 마찬가지로 페르미온인 중성자가 축퇴되어 중력에 맞서게 됩니다. 이를 중성자별이라 하며 대략 표면 중력은 지구의 수 십억 배가됩니다. 태양질량보다 약 8배 이상인 경우에는 중력이 중성자 축퇴 압력보다 커져 별이 중력붕괴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 붕괴가 일어나면 불랙홀이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백색왜성으로 처음 발견된 것이 시리우스의 반성인데 원래 이 반성은 시리우스 쌍성 계의 주성이었다가 위와 같은 진화에 의하여 백색왜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시리우스 반성은 크기는 지구정도인데 질량은 태양질량 정도입니다.
백색왜성 발견의 중요성은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쌍성 계의 진화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물리학적으로 양자역학에서 예측한 페르미 입자 (페르미온; 전자, 양성자, 중성자처럼 스핀이 1/2인 입자)의 축퇴 상태가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뿐만 아니라, 강한 중력 (지구의 수십만배)에서의 물리적 특징, 이를테면 일반상대론에서 예측하는 중력에 의한 시간의 지연, 도플러효과 따위를 실험할 수 있는 천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결국 우주는 물리학 이론 실험의 장이 됩니다.
만약 사용 가능한 핵연료를 모두 소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를 모두 소모하게 되면 별이 수축하겠지요. 더 이상 압력이 중력을 지탱할 수 없게되니까 말이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심부는 급격하게 수축하는데 반하여 별의 외각은 아직도 산발적으로 핵반응이 일어나거나 팽창하고 있어 중심부와 외각부분이 분리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별의 겉 거죽이 밖으로 팽창하는 단계를 행성상 성운이라 부릅니다.
두 별이 쌍으로 있는 쌍성의 경우에는 더 재미있는 상태가 됩니다. 둘 중 질량이 큰 놈 (주성)이 먼저 진화하여 거성-초거성 단계로 진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성이 팽창하여 마침내 주성의 외각부분에 있는 가스가 질량이 작은 반성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최후에는 주성의 질량이 반성 쪽으로 이동하여 반성의 질량이 주성보다 커지고, 핵연료를 모두 소모한 주성은 수축하게 됩니다.
핵연료를 모두 소모한 별은 수축하여 무한히 작아질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질량이 태양의 1.44배 이하인 별의 경우 핵연료를 모두 소모한 별의 내부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밀도는 아주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자역학적으로 전자는 축퇴되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자 하나가 차지해야 하는 공간은 양자역학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보다도 작은 공간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들 사이에 배타적인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축퇴압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축퇴압력이 중력에 맞서게 됩니다. 이것이 백색왜성인데 빛은 중력에너지, 즉 위치에너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태양질량의 1.44배보다 크고 태양의 수 (3- 8배)보다 작은 별의 경우에는 중력이 축퇴압력을 넘어 전자축퇴는 붕괴되어 수축하여 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별의 온도가 높고 압력도 높은 상태에서는 양성자 + 전자 --> 중성자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거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천체가 되는데, 이때 전자와 마찬가지로 페르미온인 중성자가 축퇴되어 중력에 맞서게 됩니다. 이를 중성자별이라 하며 대략 표면 중력은 지구의 수 십억 배가됩니다. 태양질량보다 약 8배 이상인 경우에는 중력이 중성자 축퇴 압력보다 커져 별이 중력붕괴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 붕괴가 일어나면 불랙홀이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백색왜성으로 처음 발견된 것이 시리우스의 반성인데 원래 이 반성은 시리우스 쌍성 계의 주성이었다가 위와 같은 진화에 의하여 백색왜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시리우스 반성은 크기는 지구정도인데 질량은 태양질량 정도입니다.
백색왜성 발견의 중요성은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쌍성 계의 진화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물리학적으로 양자역학에서 예측한 페르미 입자 (페르미온; 전자, 양성자, 중성자처럼 스핀이 1/2인 입자)의 축퇴 상태가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뿐만 아니라, 강한 중력 (지구의 수십만배)에서의 물리적 특징, 이를테면 일반상대론에서 예측하는 중력에 의한 시간의 지연, 도플러효과 따위를 실험할 수 있는 천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결국 우주는 물리학 이론 실험의 장이 됩니다.